 1. 존 딕슨 카를 읽고 있으면 숨이 막 턱턱 막힐 것 같습니다.
1. 존 딕슨 카를 읽고 있으면 숨이 막 턱턱 막힐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읽은 “아라비안 나이트 살인사건”이 그랬어요.
이 아저씨는 작가들 중에서도 유난히 시간 구성이 빡빡한데
유난히 이 작품이 그게 심했단 말이죠.
여하튼 “아라비안 나이트 살인사건”은 인물들도 많고, 사건도 복잡한 편입니다. 하룻밤 새에 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이 한두개가 아닌데다 한 작품 내에서 주요 화자가 세 명이나 되거든요. 왠지 헥헥거리며 따라간 것 같습니다. 재미는 있었는데 희극적인 요소가 그토록 과다하게 흘러넘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희극적인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것이 묘하달까요.
….흑흑, 하필 그 친구만은 아니길 바랬던 인물이 범인이라니, 넘해. ㅠ.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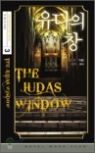 2. “유다의 창”은 훨씬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구성 자체가 간결하고, 사람의 호기심은 물론 함정에 빠진 불쌍한 젊은이에 대한 연민까지 팍팍 자극하는데다 메리베일 경을 비롯한 화자들이 워낙 경쾌해서 대단히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법정 장면에서 상당한 쾌감도 느낄 수 있고요.
2. “유다의 창”은 훨씬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구성 자체가 간결하고, 사람의 호기심은 물론 함정에 빠진 불쌍한 젊은이에 대한 연민까지 팍팍 자극하는데다 메리베일 경을 비롯한 화자들이 워낙 경쾌해서 대단히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법정 장면에서 상당한 쾌감도 느낄 수 있고요. 이제 존 딕슨 카 시리즈는 “기묘한 시리즈”만 읽으면 되겠네요. 후후후후후.
 3. “최면전문의”는 조금 독특한 소설입니다. 수사관인 유나 경감도 특이하지만 [아, 이 인물 마음에 들더구만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달까요, 캬캬캬캬] 최면전문의인 에릭과 그의 과거를 파고들고 있거든요.
3. “최면전문의”는 조금 독특한 소설입니다. 수사관인 유나 경감도 특이하지만 [아, 이 인물 마음에 들더구만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달까요, 캬캬캬캬] 최면전문의인 에릭과 그의 과거를 파고들고 있거든요.전 최면이 신기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상당히 회의적이고 따라서 저는 걸리지 않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는 인간인지라[어찌보면 종교에 대한 태도와도 비슷하겠군요.] 흥미로운 소재라고는 생각하면서도 이입보다는 거리를 두게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광기’가 지배하는 작품입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나마 에릭이 조금 나아 보이지만 그 사람도 문제가 심각하죠. 회상 장면이 굉장히 길고 약간 거슬렸습니다. 작품 전체로 보면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지만, 음, 너무 단순하게 끼워넣었어요. 다만 영상화에 적합한 구성과 시각적 효과를 갖추고 있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