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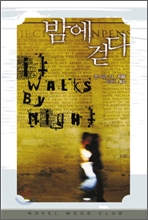
 1. “구부러진 경첩”
1. “구부러진 경첩”
2. “밤에 걷다”
3. “셜록 홈즈 미공개사건집”
추리소설이 필요해서 존 딕스 카의 이름을 훑었는데 결국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은 내 기분 탓인지 “셜록 홈즈 미공개사건집”이었다. 일단 아무리 거장 작가라 한들 “팬픽”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지라 기대 자체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이 도움이 되었던 듯 하다. 이런 젠장, 역시 모든 작가들의 원동력은 팬심이었단 말인가. ㅠ.ㅠ 가장 중요한 특성을 잃지 않고도 유머감각이 한차원 업그레이드된 홈즈라니, 너무 좋잖아.
“구부러진 경첩”의 경우에는 오랜만에 펠 박사를 만나 반가웠다. 그 아저씨는 늘 우중충한 분위기에만 등장하시는 듯 하다. 일단 사건의 시작에서부터 호기심을 한번 자극해 준 다음, 이후에는 살인사건으로 다시 한번 궁금증을 유발, 계속해서 작은 단서들로 독자들을 긁어주는 솜씨가 일품이다. 첫번째 수수께끼는 간단하지만 살인사건의 트릭은 말미에 이를 때까지 풀지 못했다. 사기야, 이건. ㅠ.ㅠ
“밤에 걷다”는 밀실 살인사건으로 그야말로 정석에 해당한다. 일단 분위기를 깔고 시작하는 것 하며, 수상쩍인 인물 하며. 범인은 금세 짐작이 가지만 언제나 문제는 방법이다. 방법도 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빗나갔어. 쳇. 4.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
4.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
생전 처음 읽은 필립 K. 딕의 소설을 기억한다. 당시에는 그 작품이 실린 책의 제목도, 작가의 이름도 알지 못했지만 그 결말의 충격만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때는 “사기꾼 로봇”이라는 제목도 아니었다. 이상하게도, 작가의 이름에 신경쓰지 않던 그 어린 시절에도 이 사람이 쓴 소설은 SF 단편집에서 언제나 구분해낼 수 있었다.
“블레이드 러너”도 좋아한다. 해리슨 포드보다도 그 어두운 비내리는 도시가, 죽어가는 안드로이드가 주인공이었던 영화의 감독판을 찾아 비디오방을 헤매기도 했었다.
하지만 역시 영화는 책을 못따라가는구나. 그건 리들리 스콧의 영화였지.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강렬하다. “높은 성의 사나이”를 읽고 그의 장편에 실망한 적이 있었는데, 취소하겠다. 역시 당신의 장점은 이렇게 추상적인 문제를 멋부리며 빙빙 돌릴 필요 없이 직설적으로 던져주는 것이다. 꾸밈없고, 세련되다. 검은 양에게 조의를.  5. “별을 쫓는 자”
5. “별을 쫓는 자”
젤라즈니의 집대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겠다. 여러 번 사용해왔던 신화적 설정과 앰버에서 볼 수 있었던 정신적인 세계가 혼합되어 있다. 상당히 정신줄 놓고 읽긴 했는데 후반부에 가면 더 이상 캣과의 대결은 중요한 게 아니고, 때문에 초반의 암살자도, 캣도 소모된 듯한 느낌이다. 오히려 흥미로운 것은 인간 초능력자들(특히 각각의 인생역경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나도 모르게 웃음을 터트려버렸다. 이런 유머감각이라니). 그들이 정신적 능력에 있어 새로운 발견을 함에 따라 빌리가 사라진 뒤에도 이 세계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6. “브라질에서 온 소년들”
6. “브라질에서 온 소년들”
전체 스토리를 알고 있는 이 책을 읽은 이유는 단 한가지다.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 기억에 의하면 이것과 똑같은 내용의 단편을 어린 시절 [아마도 추리소설] 단편집에서 읽은 적이 있다. 워낙 인상적인 내용인지라 마지막 문장이 “소년이 문을 열어주었고, 그 얼굴을 본 주인공이 놀라는 것”으로 끝난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라 레빈의 이 장편소설이 그것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었다. 아마도 그 작품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형사인지 누군지가 수사를 하는 내용이었을 테다. 얼궤가 마치 발췌를 한 듯 비슷하되 세부 사항은 다르다. 난 대체 무얼 읽은 것인가. -_-;;;
가장 중요한 사실을 이미 알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여러 면에서 흥미진진하다. 낯선 배경, 뜻밖의 피해자들, 리베르만이 뛰어다니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 멩겔레라는 인물에 대한 묘사까지도. 그리고 어김없이 작가는 마지막에 한 마디를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는다. 어유, 짓궂기는.
여전히 시체와 피가 부족하다. 아직 읽지 않은 SF와 판타지 소설들이 쌓여 있는데 쉽게 손이 가지 않는다. 현대의 탐정들은 너무나 행동파에 감정적이라서 쫓아가기가 버겁달까.
어라, 혹시 나 단순히 추리소설이 아니라 냉정한 ‘관찰자 시점’이 그리워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가? 미치겠군. -_-;; 인간 취향 참 갈 데가 없으니 거기까지 가는구나.
……그리고 책장도 무너지고 있다. 나도 좌판이나 벌일까보다, 흑흑. ㅠ.ㅠ

eye of cat은 출장가기 전까지 2부를 읽고 있었는데 많이 실망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게 들어가려 했고 산발적인 문장의 흐름으로 인해 집중을 할 수가 없더군요.
필립 씨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거라 생각만 하며 책장에 보관하고 있네요.(끄응…)
항상 느끼는 거지만 누나가 책에 깔리지 않는 건 신기하다니까요. -_-a
난 그래도 “그림자 잭”보다는 나았어. 나름 이렇게 의식의 흐름식으로 흘러가는 소설을 글만 잘 쓴다면 꽤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단지 위에서도 말했지만 버리는 게 너무 많아.
필립씨는 실망시키지 않아, 흑. ㅠ.ㅠ 예전에 실망했던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좋았어, 엉엉.
저는 요즘 책과 멀어지고 있는데 엄청 달리고 계시군요. 집에 책을 얼마나 쌓아두신 겁니까?
언제 “삘”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박스 하나 정도는 구비해둡니다, 훗. 그리고 일단 “삘”을 받으면….그건 놔두고 새책을 사기 시작하죠. ㅠ.ㅠ
쇤네는 새 책을 구할 부지런을 떨기보다 옛날 책으로 대신하는 게으름을 선택했사와요… 홈즈 전집을 다시 읽고 있사와. 그러다 보니 셜록 홈즈 미공개 사건집이 끌리는군요. 요거 시도해 볼랍니다. 🙂
저도 사실은 옛날책을 노려야 하는데 이상하게 새책만 사들이고 있어요. 원래 읽은 걸 또 읽는 성격이라 좋아하는 건 몇번이고 읽는데 요즘엔 원체 새로 나오는 애들이 많아서 옛날 애들을 그렇게 많이 사랑해주지 못하고 있네요. 죄책감이 들 정도입니다, 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