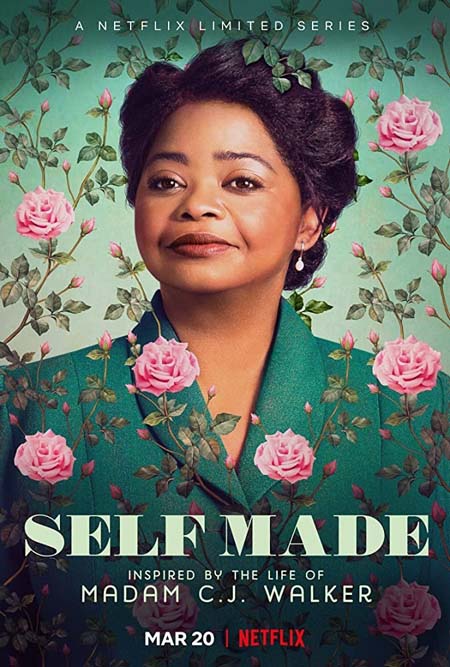메리 히긴스 클라크 기획, ‘뉴욕’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16인의 미스터리/스릴러 작가들의 기획 단편 모음집.
미국 영화나 스릴러를 읽고 자란 나 같은 인간에게 뉴욕은 가본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묘한 친숙함을 갖고 있는 공간이다. 지명과 이미지로만 알고 있는 장소들. 활자 속 파편적인 2차원 공간들은 익숙하나 3차원 공간으로 연결해 그릴 수는 없는 곳.
현대부터 2차대전, 1920년대까지 시간적 배경도 가지각색이고, 더불어 장르와 분위기도 천차만별이다.
익숙한 리 차일드에서 시작해
전형적인 범죄물인 “이상한 나라의 그녀”에서
거의 편견에 가깝다고까지 해야 할 어퍼 사이드의 분위기를 그려낸 “진실을 말할 것”에서
“지옥으로 돌아온 소녀”로 이어지는 흐름이 좋았다.
희곡 형식의 “함정이다!”도 그 형식과 첼시라는 배경에 맞물려 눈에 띄는 작품이었고.
금방 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렸어.
요즘처럼 아무 곳에도 갈 수 없는 시대에, 한바탕 관광을 하고 온 느낌이었다.